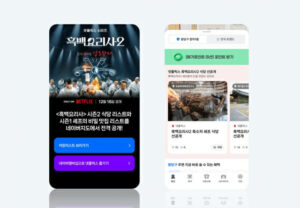영국의 익명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Banksy)가 또다시 사회를 뒤흔드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현지시간 8일 새벽, 런던 중심부 로열 코트 오브 저스티스(Royal Courts of Justice) 외벽에는 붉은 피켓과 검은 법복, 그리고 높이 치켜든 법봉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신작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
“비무장 시위대는 쓰러져 있고, 가발을 쓴 판사가 법봉을 휘두른다.” — 작품 설명 중
뱅크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banksy라는 서명 대신 장소 태그만 남기며 진품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1시간 만에 런던시와 법원 시설 관리국은 “건물은 19세기 등록문화재여서 원형 보존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철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진=Reuters/연합뉴스
이번 벽화는 영국 정부의 집회‧시위 규제 강화를 겨냥한 풍자로 해석됩니다. 법복을 걸친 인물은 ‘법의 이름으로 폭력’이라는 상징성을 담았고, 시위자의 피켓에는 페인트가 흩뿌려져 자유와 표현의 희생을 시사했습니다.
예술계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뱅크시 특유의 직설 화법”이라며 반겼지만, 법원 측은 “문화재 관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철거를 고수했습니다.
실제로 런던 외벽 작업물은 소유주 동의 없이는 저작권과 재산권 모두가 얽혀 법적 갈등을 불러옵니다. 2018년 ‘풍선과 소녀’ 절반 파쇄 사건처럼, 작품 보존 여부는 언제나 첨예한 논쟁을 낳아 왔습니다.

사진=Hypebeast 제공
런던 시의회 관계자는 “철거 대신 투명 보호막을 씌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보수 단체는 “공공건물 훼손”이라며 사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작품의 잠재 경매가는 최대 1500만 파운드(약 250억 원)로 거론됩니다. 작품이 실제 철거될 경우, 일각에서는 “벽체를 통째로 떼어내 민간에 매각하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뱅크시는 1990년대 브리스톨에서 활동을 시작해 게릴라식 설치·그래피티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익명성은 그 가치를 더욱 높였고, 작품 출현 때마다 관광객이 몰려드는 경제효과도 입증돼 왔습니다.

사진=JoongAng
하지만 도시 미관·법적 분쟁·문화재 보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결문보다 강렬한 한 장의 그림이 대중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소통 창구로서의 그래피티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향후 런던시는 △보존 위원회 심의 △문화재청 자문 △지역 주민 공청회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
한편 뱅크시 측은 철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24시간 스트리밍”을 제안했으며, 시민들은 SNS에서 #SaveTheMural 해시태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술, 법, 사회 정의가 교차하는 현장의 축소판입니다. 과연 작품은 사라질지, 아니면 새로운 보존 모델을 제시할지 세계 미술계의 시선이 런던 법원 외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