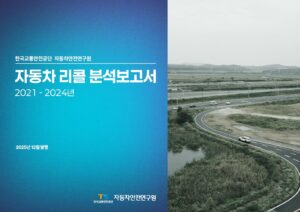출처: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 군함도(일본명 하시마)는 세계유산 명단에 오른 순간부터 ‘산업혁명의 상징’과 ‘강제동원의 현장’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군함도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정식 의제로 다룰지 여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초유의 표대결을 벌였습니다.
표결 결과, 한국 정부가 제안한 의제 채택은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무산됐습니다.1
한국 외교부 관계자 – “유감입니다. 일본이 약속을 지키도록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등재하면서 『강제노동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릴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서면으로 약속했으나, 설명관 내부 안내판에는 강제동원 문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은 2023년 유네스코 결정문에 따라 2025년까지 ‘보존 상태 보고서’(SOC) 제출이 의무라고 해석하며 군함도 문제를 자동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일본은 ‘후속조치 업데이트 보고서’만으로 충분하다며 의제 상정 자체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21개 위원국 중 중남미·유럽 일부가 일본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번 표대결은 양국이 과거사 이슈를 국제 기구에서 정면 충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의 ‘해빙 무드’에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외교적 협상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합니다.
한국 정부는 ‘희생자 기억센터’ 설치, 언어별 안내 개선 등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일본에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내 시민단체 역시 “군함도는 인권 문제이며, 역사 왜곡은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관광 측면에서는 폐허가 된 콘크리트 건물과 바다 위 실루엣 덕분에 ‘포스트 아포칼립스 성지’로 주목받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결국 군함도 논란은 산업유산 보존과 인권 가치가 충돌할 때 국제사회가 어떤 기준을 택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음 세계유산위 보고 시한인 2026년 2월까지,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이번 논쟁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