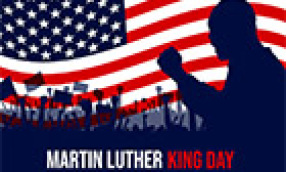시민이 만든 신문, 한겨레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종이신문 중심의 전통매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디지털 퍼스트를 선언하며, 데이터저널리즘·멀티플랫폼 영상·독자 참여형 콘퍼런스를 세 축으로 하는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
첫 번째 변화는 탐사보도 DNA의 확장입니다.
“심층 취재를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재구성해 독자가 체험형 스크롤 기사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는 편집국 전략에 따라, 3D 그래픽·인터랙티브 차트를 적용한 ‘기후위기 해설 시리즈’가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두 번째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을 중심으로 한 정책 싱크탱크 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5월 출범한 ‘지속가능 전환랩’은 ESG, 노동, 주거 의제를 집중 연구하며 1월 2회 브리프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소셜 콘택트입니다. 트위터(@hanitweet), 인스타그램(@hani.pic) 등 팔로어 130만 명 규모의 계정을 통합 관리해 뉴스 알림–라이브 커머스–카톡 채널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연결했습니다.

한겨레21은 ‘읽는 잡지’에서 ‘보는 매거진’으로 진화했습니다. 4K 다큐, 팟캐스트 ‘H21 스토리’, 뉴스레터 ‘깊게파기’를 통해 구독층을 넓혔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실험도 눈길을 끕니다. “코드 짜는 기자”를 양성하기 위해 사내 교육 플랫폼 ‘H-LAB’이 가동됐고, 파이썬·R·GIS를 배우는 기자가 70명을 넘었습니다.
콘텐츠 유통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OTT·유튜브 전용 다큐 시리즈 ‘탐사극장’이 넷플릭스 TOP10에 오르며 광고·제휴 수익을 창출했고, 멤버십 구독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 독자 참여도 강화했습니다. 한겨레 독자위원회가 올해부터 온라인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바뀌어, 1천여 명이 실시간으로 기사 피드백을 남기고 기자가 즉시 답변하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지역밀착 프로젝트 ‘우리동네 리포터’는 대기오염·수질오염 모니터링을 시민과 함께 진행하며, 데이터는 환경부 공공 API와 연결해 정책 제안서로 활용됩니다.
수익 모델도 눈에 띕니다. Hankyoreh Edge라는 프리미엄 B2B 리포트를 출시해 기업·학교·공공기관 430곳이 구독 중이며, 아카이브형 API를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판매합니다.
또한 ‘녹색채권 랭킹 지수’를 개발해 금융권과 ESG 협력을 확대했고, 메타버스 가상뉴스룸을 통해 해외 독자와 기자 간 ‘아바타 인터뷰’β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한편 편집국–독자센터–연구원을 잇는 ‘3웨이 팩트체크’ 시스템이 가동돼, 올 8월까지 허위정보 119건을 바로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겨레의 변화가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가속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김선영 교수는 “탐사보도 전통과 디지털 혁신이 결합해 ‘포스트 플랫폼 저널리즘’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자 반응도 뜨겁습니다. H-LIVE 설문에 따르면 ‘한겨레가 가장 잘하는 영역’ 1위는 기후·에너지, 2위는 사회적 약자 인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룸 내부에는 ‘디지털 전문직군’을 새로 만들고, 개발자·디자이너·PD·데이터사이언티스트가 기자와 동등한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전직군 통합 인사평가 제도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 요약하면, 한겨레의 37년사는 이제 “시민의 힘으로 태어나 디지털로 재도약”이라는 구체적 비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탐사보도는 더욱 깊어지고, 독자와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변화의 다음 페이지가 주목됩니다.
자료·이미지 출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한겨레21, Hankyoreh SNS, 라이브이슈KR 취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