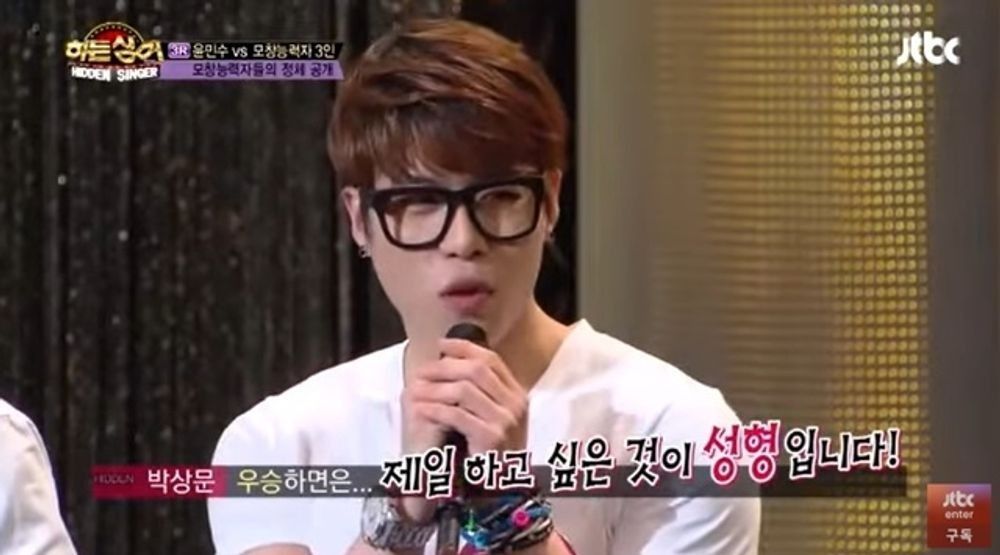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국민신문고·관세청 시스템 등 약 70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동시에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첫 불길은 24일 03시 32분경 2층 UPS(무정전전원장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15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80여 대의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UPS 내부 배터리가 완전히 타버리면서 핵심 서버 라인이 고열과 연기에 노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24·국민신문고·민원24·행정안전부 홈페이지·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 전산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했으나, 배터리 화학 반응으로 열폭주가 가속됐다”면서 “2 백업 센터로의 즉각 전환이 지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재난 복구(R/DR)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세종센터와 광주센터에 분산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순차 복구를 진행 중입니다.
우선 24일 18시 기준 민방위 사이버 교육·농림부 귀농귀촌 지원 사이트 등 15개 서비스가 정상화됐으며, 정부24 필수 민원 20종은 48시간 내 임시창구를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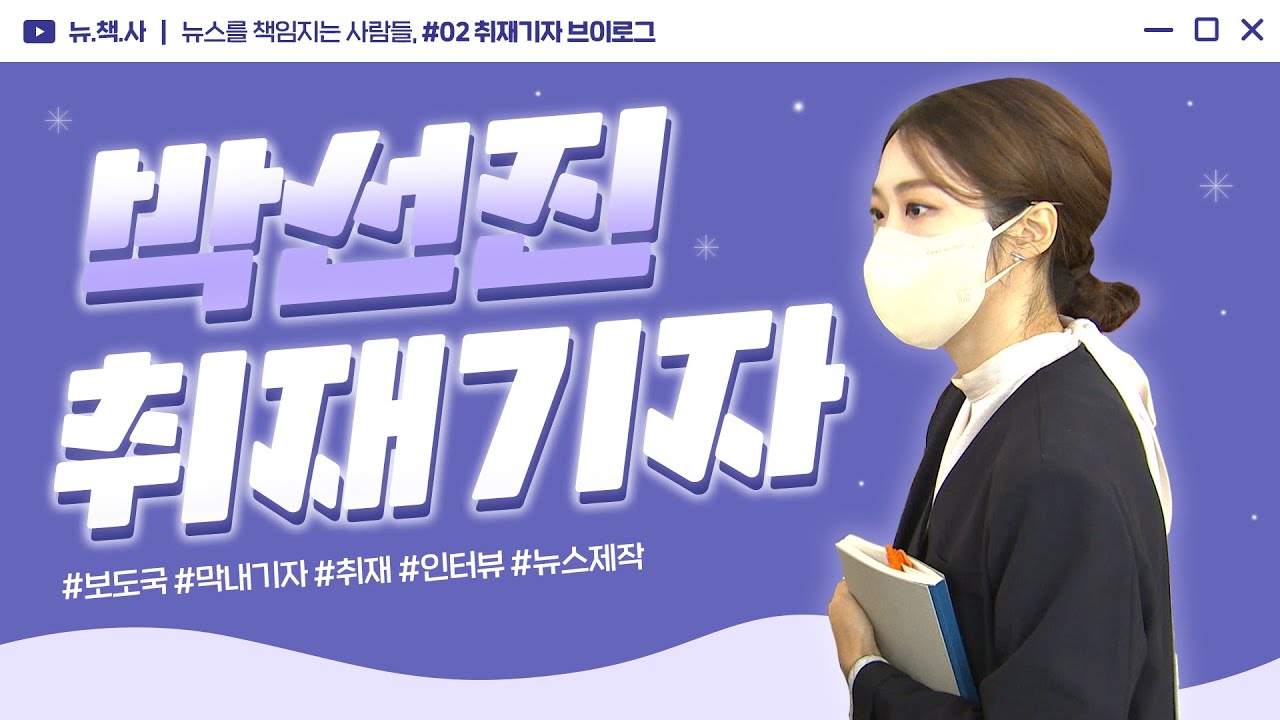 이미지 출처: 대전MBC 유튜브 캡처
이미지 출처: 대전MBC 유튜브 캡처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외국 화주와 통관 일정이 얽혀 있어 3일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화물 적체로 물류 비용이 하루 20억 원가량 증가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T 업계는 이번 화재가 “UPS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와 “센터 내부 공조시스템 설계 미흡”이 결합된 복합 재난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측은 “국가 데이터센터도 클라우드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부터 ‘사이버 재난안전 특별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번 사태로 제도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KAIST·대덕연구단지 연구진은 “AI 기반 예측 정비(PdM) 솔루션을 도입하면 비슷한 사고를 8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
대전 동구 원동 상인은 “새벽 사이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잠을 설쳤다”며 “대전 화재라는 단어가 포털 상위권을 장식해 손님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25일 오전 9시 신속 복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① 전력 라인 이중화, ② UPS 실 내화 설비 확충, ③ 원격 모니터링을 골자로 한 ‘데이터센터 안전 강화 3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대전센터-광주센터 간 광역 전용망을 증설해 지연 시간을 40% 감축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① 마이크로 모듈형 데이터센터 도입과 ②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이 해법”이라 입을 모읍니다.
이는 곧 대전이 ‘스마트 시티’를 넘어 ‘디지털 레질리언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복구율 40%, 완전 정상화 목표는 28일 24시로 제시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데이터 무결성 검증 후 단계별로 서비스를 열 예정”이라며 “정부24의 주요 민원은 동 주민센터(☎ 120)에서 오프라인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대전 화재 사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안전’과 ‘편리’가 동전의 양면임을 일깨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 모두가 데이터센터 안전 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