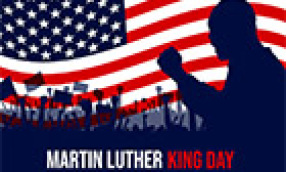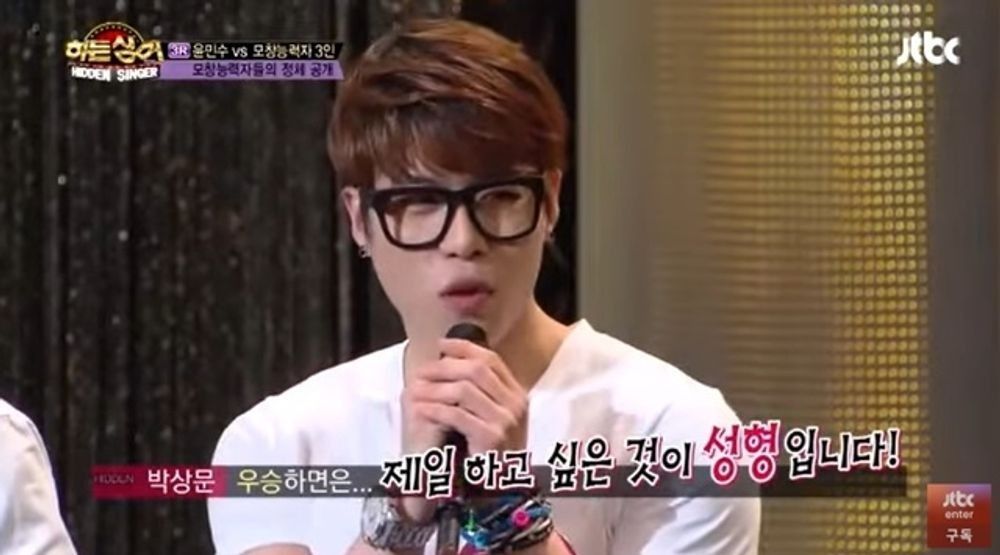
🌏 토양오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수질·대기·생태계로 동시에 확산되는 복합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관리 대상 오염토양1)의 30%가 방치된 주유소 부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망한’ 주유소만 환경부 소관이라는 부처 칸막이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신문 10월 3일 보도는 “폐업 주유소는 환경부, 운영 중인 주유소는 산업부”로 갈라진 행정이 정화 속도를 늦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는 최근 남O지역 토양오염 정화 설계용역 등 10억 원대 발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화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임을 시사합니다.

법률 쟁점도 뜨겁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판결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범위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건설사가 오염토 양 정화 책임을 지도록 한 선고로, 업계 대응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지역 현안도 큽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를 두고 “객관적 토양오염 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민 참여 조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금속·석유계 탄화수소 오염 차이를 구분해 맞춤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철산화물 기반 안정화제 등 친환경 정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은 생분해성 복합 자재를 이용한 원상복원 공법을 신기술로 소개했습니다. 💡 이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 40% 절감합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상주시 고시 자료에 따르면 24h 내 측정 의무가 있는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12%가 매년 보고서를 누락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
“토양은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예방이 곧 비용 절감입니다.” — 이지훈 한국환경공단 박사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폐엔진오일은 반드시 지정 수거함에 버리고, ② 가정용 농약은 용기째 폐기, ③ 도시 텃밭은 토양 중금속 간이 키트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AI 기반 토양오염 예측 플랫폼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는 위성 영상·드론 센서 데이터를 융합해 실시간 위험도 지도를 제공합니다.
결론입니다. 토양오염은 더 이상 ‘땅속 문제’가 아닙니다. 정밀 조사·기술 혁신·주민 참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이 완성됩니다.
✅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정화 사업 성과와 법·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