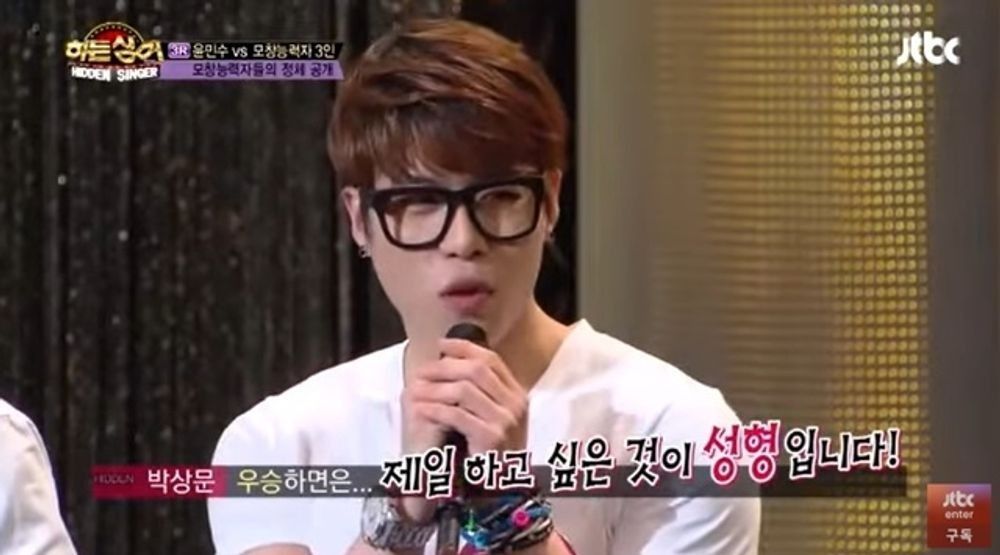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연이어 발생한 추락·협착 사고로 전 현장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 사고 개요
4일 오후 1시 34분경, 경기도 시흥 안현동 터널 갱도 안에서 전력 케이블 점검 작업을 하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과 로프를 동원해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 올해 네 번째 중대 사고
포스코이앤씨는 올 들어서만 4건의 사망·중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1. 2월 신안산선 작업장 추락사, 5월 군위댐 현장 협착사, 7월 신안산선 전선교체 중 감전사, 그리고 이번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구호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 포스코이앤씨, 어떤 기업인가?
포스코 그룹의 건설 부문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는 1982년 설립돼 토목·플랜트·주택·인프라 등 EPC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10조 원을 넘어섰고, 해외 20여 개국에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 누계 사망자가 11명을 기록하면서 ‘안전 관리 부실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 사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하는 정희민 사장 (사진=뉴스1)
■ 정부·기관의 압박 수위 ↑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공공공사 PQ 평가에서 안전관리 실적 감점을 예고했습니다. 시사저널e는 “李정부 첫 타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국책 수주전이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은 강남본부 재건축(4,989억 원), 홍천 양수발전소(2조 원) 등 대형 입찰에서 경쟁사들이 ‘안전 리스크’를 강조하며 포스코이앤씨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대응과 한계
정희민 사장은 7월 29일 “모든 현장을 일시 중단하고 외부 안전 컨설팅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재개 첫날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여주기식 중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공정별 Lock Out·Tag Out을 전면 확대하고,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는 다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계·시민단체 반응
건설노조는 “연속 사망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출근 저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기업”이라며 대표이사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 금융시장 영향
같은 날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1.8% 하락했고, ESG 펀드들은 포스코이앤씨 지분 비중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공표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안전 투자 확대 없이는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 전문가 제언
한국건설안전학회 박진수 교수는 “다발 사고의 원인은 조직문화”라며 “안전 KPI를 CEO 보수와 연동하고, 위험도 기반 예산 배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선진사는 Digital Twin과 AI 기반 예측정비 시스템으로 재해율을 60% 줄였다”며 기술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 향후 과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하반기까지 안전예산 3,000억 원을 집행하고, 모든 현장에 ‘스마트 안전벨트’·‘AI CCTV’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사 800곳에 ‘안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해 원·하청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신뢰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고 대응이 곧 글로벌 수주전의 열쇠”라며 포스코이앤씨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 결론 — ‘철의 DNA’를 가진 포스코이앤씨가 진정한 ‘안전 DNA’를 조직에 심지 않으면 더 이상 국내외 발주처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반복된 사고는 통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업 스스로 ‘사고 제로’ 문화를 실천할 때 비로소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